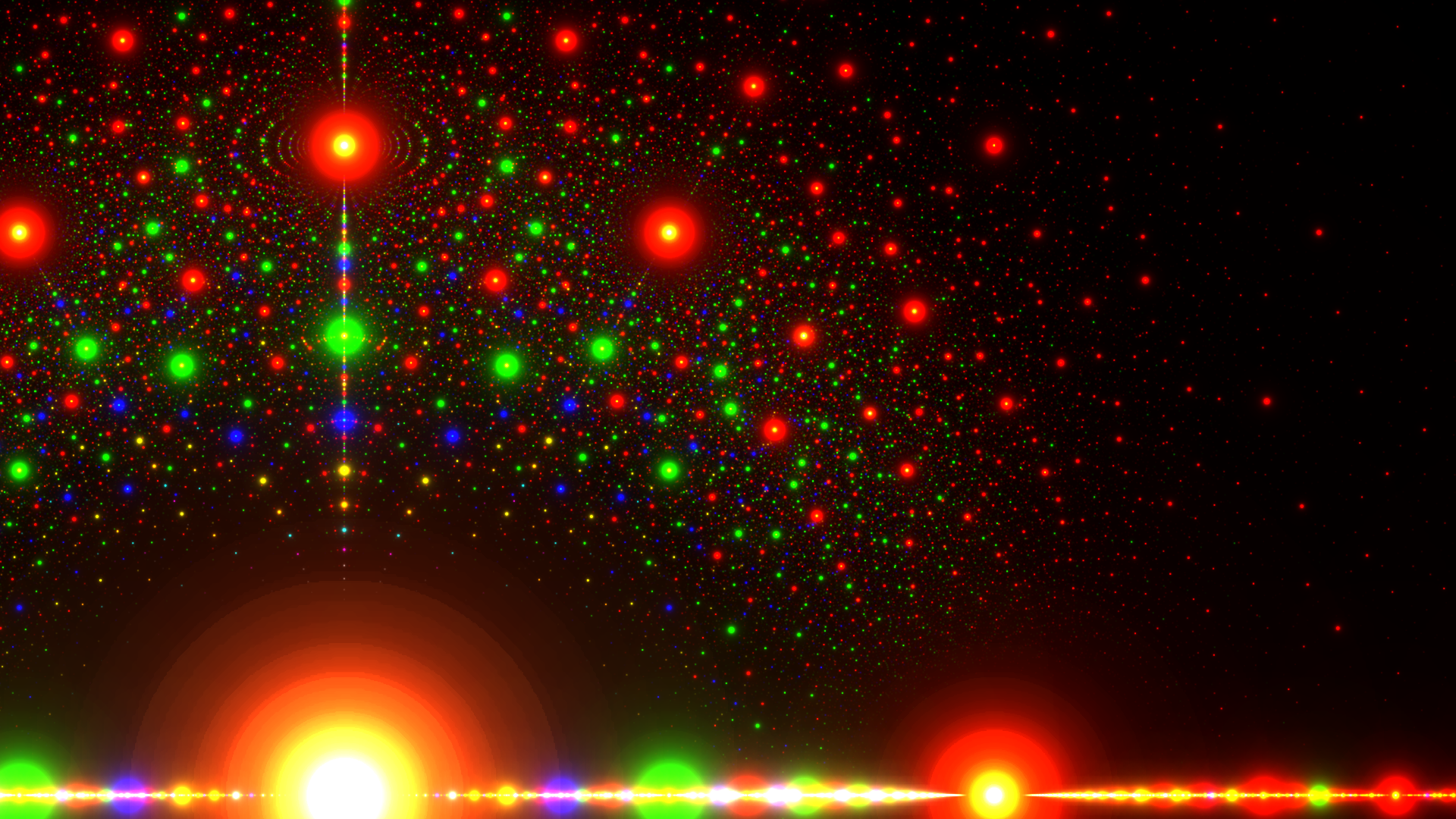로 표기한다.
대수적 수 의 최소 다항식의 분모를 없애고, 모든 계수가 서로소인 정수 계수 다항식으로 만들었을 때, 계수의 절댓값의 최댓값을 의 (고전적) '''높이''' ((classical) height)라고 한다.
또한, 를 를 포함하는 상의 차 대수체라고 할 때,
가 상의 정규(곱셈) 부치 전체를 거칠 때의 곱
:
는 의 선택에 관계없이 정해진다. 이 값을 의 '''절대 높이''' (absolute height)라고 부르며,
:
를 의 '''로그 높이''' (logarithmic height)라고 부른다. 의 최소 다항식을
:
라고 하면,
:
이 성립한다.
3. 성질
복소수 가 대수적 수라는 것은 다음 조건들과 동치이다.
- 이지만 인 일계수 다항식 가 존재한다.
- 인 대수적 정수 가 존재한다 ().
대수적 수들의 집합은 체를 이루며, 라고 쓴다. 이는 대수적 정수들의 정역의 분수체이다.
:
대수적 수가 아닌 복소수를 초월수라고 한다. 원주율 의 유리수 배에서의 삼각 함수 , , 의 값은 대수적 수이다. 게다가, 대수적 수의 사칙 연산에 의한 결과 또한 대수적 수이다.
에르미트는 1873년에 자연로그(네이피어 수) 가 초월수임을 증명하였고, 린데만은 1882년에 원주율 가 초월수임을 증명하였다.
복소수 에 대해, 유리수를 계수로 하는 다항식
:
이 존재하여 이 될 때, 는 대수적 수라고 한다.
정수 이 존재하여,
:
이 성립할 때도, 는 대수적 수라고 한다.
대수적 수 를 근으로 하는 0이 아닌 정수 계수 다항식으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것(모닉 다항식)이 존재할 때, 는 대수적 정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수나, , 는 대수적 정수이다. 정수 를 대수적 정수 중에서 특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 원소를 유리 정수라고 부른다.
를 차 대수적 수라고 할 때, 나 가 차 대수적 수라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라고 하면, 이들은 모두 2차 대수적 수이지만, 나 는 모두 4차 대수적 수이다.
일반적으로,
:
가 성립한다.
유리수체에 유한 개의 대수적 수를 첨가한 체는, 어떤 1개의 대수적 수를 유리수체에 첨가한 체와 같으므로, 유리수체의 유한 차 확대체(대수적 수체)가 된다.
반대로, 임의의 대수체는, 유리수체에 대수적 수를 첨가한 체와 동형이므로, 대수적 수를, 대수체의 원소로 정의할 수도 있다.
임의의 유리수에 대해, 덧셈, 곱셈, 및, 거듭제곱근을 취하는 연산을 유한 번 적용함으로써, 대수적 수를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다.
3. 1. 대수적 수의 체
대수적 수들의 집합은 체를 이룬다. 즉, 대수적 수들의 합, 차, 곱, 그리고 0이 아닌 수로 나눈 결과는 다시 대수적 수이다.
이를 결합자를 사용하여 구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1] 대수적 수의 체는 또는 A로 표기하는데, A는 일반적으로 아델 링을 나타낸다.[1]
대수적 수의 체는 가산 무한 집합이다.[2] 즉, 그 크기는 알레프-0()이다.[2] 복소수체의 크기는 이므로, 대부분의 복소수는 대수적 수가 아니다.[2]
대수적 수의 표수는 0이며, 유리수체의 대수적 폐포이다.[3] 모든 대수적 수는 어떤 대수적 수체에 속한다. 즉, 대수적 수의 집합은 (복소수체로의 매장을 부여한) 모든 대수적 수체들의 합집합과 같다.[3]
대수적 수의 체를 유리수체의 확대체로 보았을 때, 는 무한 차수의 갈루아 확대이다. 이 확대의 갈루아 군은 유리수체의 절대 갈루아 군이다.[3]
는 유리수체의 무한 차원 대수적 확대체이다. 또한, 대수적 수를 계수로 하는 0이 아닌 다항식의 근은 대수적 수이므로, 는 대수적 폐체이다. 또한, 유리수체를 포함하는 임의의 대수적 폐체는 를 포함하므로, 유리수체의 대수적 폐포이기도 하다.[4]
3. 2. 대수적 정수의 환
대수적 정수의 집합은 환을 이룬다. 즉, 대수적 정수의 합, 차, 곱은 다시 대수적 정수이다.
대수적 정수환은 다음 성질들을 만족시킨다.[1]
따라서, 대수적 정수의 인수 분해는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지만, 유한 개의 대수적 정수의 최대공약수를 정의할 수 있다.[1]
모든 대수적 정수는 어떤 대수적 수체의 대수적 정수환의 원소이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 즉, 대수적 정수의 집합은 모든 대수적 수체의 대수적 정수환들의 합집합이다.[2]
대수적 정수환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4]
- (즉, 유리수인 대수적 정수는 유리 정수이다. 를 '''유리 정수환'''이라고 한다.)
- 임의의 대수적 수 ''α''에 대해, 대수적 정수 ''β''와 유리 정수 ''d''가 존재하여, ''α'' = ''β''/''d''가 된다.
- 0이 아닌 대수적 정수의 하우스는 1 이상이다. 하우스가 1인 대수적 정수는 1의 멱근에 한정된다.
또한, 와 마찬가지로, 대수적 정수를 계수로 하는 모닉 다항식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다항식)의 근은 역시 대수적 정수이므로, 정수환은 정폐포이다.[4]
3. 3. 유리수의 단순 확장의 차수
임의의 복소수 α에 대한 단순 확장 Q(α)의 차수가 유한할 때, 그리고 그때에만 α는 대수적 수이다.
유한 차수 조건은 Q(α) 안에 {ai | 1≤i≤k}라는 유한 집합이 존재하여 Q(α) = Σi=1k aiQ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ai 자체도 Q(α)의 원소이므로, 각 ai는 유리수와 α의 거듭제곱의 곱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조건은 어떤 유한한 n에 대해 Q(α) = {Σi=-nn αiqi | qi∈Q}라는 요구 조건과 동치이다.
후자의 조건은 αn+1 자체가 Q(α)의 원소이므로, Σi=-nn αiqi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과 동치이며, 따라서 α2n+1 = Σi=02n αiqi-n 또는, 동치적으로 α가 x2n+1-Σi=02n xiqi-n의 근이라는 것이다.
3. 4. 대수적 폐포
계수가 대수적 수인 다항식 방정식의 모든 근은 다시 대수적 수이다. 이는 대수적 수의 체가 대수적으로 닫혀 있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사실, 이 체는 유리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대수적으로 닫힌 체이므로, 유리수의 대수적 폐포라고 불린다.
대수적 수의 체가 대수적으로 닫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계수가 대수적인 수 인 다항식 의 근을 라고 하자. 그러면 체 확장 는 에 대해 유한한 차수를 갖는다. 단순 확장 는 에 대해 유한한 차수를 갖는다 (의 모든 거듭제곱은 최대 까지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에 대해 유한한 차수를 갖는다. 는 의 선형 부분 공간이므로 에 대해 유한한 차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는 대수적 수임에 틀림없다.
4. 관련 분야
유리수 계수를 갖는 다항식의 근이 되는 복소수를 대수적 수라고 한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정수 계수 다항식의 근이 되는 수는 대수적 정수이다. 대수적 수의 집합은 체를 이루며, 대수적 정수의 집합은 정역을 이룬다.
대수적 수가 아닌 복소수를 초월수라고 한다. 주어진 수가 대수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π + e가 초월수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수는 대수적 정수의 특수한 경우이며, '유리 정수'라고도 불린다.
4. 1. 근으로 정의되는 수
정수로부터 유한 번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n제곱근(n은 양의 정수) 연산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는 대수적 수이다. 하지만 모든 대수적 수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 x⁵ - x - 1 = 0의 유일한 실근(≈ 1.1673)은 근호와 사칙연산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는 갈루아 이론의 결과이다. (5차 방정식과 아벨-루피니 정리 참조)
4. 2. 닫힌 형식의 수
대수적 수는 유리수에서 시작하여 다항식으로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수이다.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닫힌 형식의 수"로 일반화할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다항식, 지수 및 로그를 사용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수를 "기본 수"라고 하며, 여기에는 대수적 수와 일부 초월수가 포함된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다항식, 지수 및 로그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정의된 수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대수적 수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e|e영어 또는 ln 2와 같은 몇 가지 간단한 초월수가 포함된다.
5. 예시
유리수는 모두 대수적 수이다. 예를 들어, 실수 는 의 근이고, 복소수 는 의 근이므로 대수적 수이다. 또한, 원주율(π)의 유리수 배에서의 삼각 함수 값 (sin, cos, tan)도 대수적 수로 알려져 있다.[1]
대수적 수가 아닌 복소수를 초월수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자연 상수(e)는 1873년 샤를 에르미트에 의해, 원주율(π)은 1882년 페르디난트 폰 린데만에 의해 초월수임이 증명되었다. 린데만의 증명으로 인해, 고대 그리스의 3대 작도 문제 중 하나인 원적 문제는 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2]
5. 1. 대수적 수의 예
- 모든 유리수는 대수적 수이다. 정수와 (0이 아닌) 자연수의 몫으로 표현되는 모든 유리수는 0이 아닌 다항식, 즉 의 근이 되기 때문이다.[1]
- 정수 계수 , , 를 갖는 이차 다항식 의 무리수 해인 이차 무리수는 대수적 수이다. 만약 이차 다항식이 모닉()이면, 근은 이차 정수로 분류된다.
- 가우스 정수, 즉 와 가 모두 정수인 복소수 도 이차 정수이다. 이는 와 가 이차식 의 두 근이기 때문이다.
- 작도 가능한 수는 주어진 단위 길이를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작도할 수 있는 수로, 모든 이차 무리수, 모든 유리수, 그리고 이러한 수들을 기본적인 사칙 연산과 제곱근 추출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수를 포함한다. (에 대한 기본 방향을 지정함으로써, 와 같은 복소수는 작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 기본 사칙 연산과 제곱근 추출의 조합을 사용하여 대수적 수로부터 형성된 모든 식은 또 다른 대수적 수를 생성한다.
- 기본 사칙 연산과 제곱근 추출로 표현할 수 없는 다항식 근도 존재한다. (예: 의 근). 아벨-루피니 정리에 의해 그러한 경우가 많지만 차수 5 이상인 모든 다항식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 의 유리수 배수의 삼각 함수 값 (정의되지 않은 경우 제외)은 대수적 수이다. 예를 들어, , , 는 을 만족한다. 이 다항식은 유리수 위에서 기약 다항식이므로 세 개의 코사인 값은 ''켤레'' 대수적 수이다. 마찬가지로 , , , 는 기약 다항식 을 만족하므로 켤레 대수적 정수이다.
- 일부 무리수는 대수적 수이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 와 는 각각 다항식 와 의 근이므로 대수적 수이다.
- 황금비 는 다항식 의 근이므로 대수적 수이다.
- π와 e는 대수적 수가 아니다 (린데만-바이어슈트라스 정리 참조).[2]
5. 2. 초월수의 예
원주율()이나 자연로그의 밑()은 초월수이다.
- (는 0이 아닌 대수적 수)
- 원주율
- 원적 문제는 주어진 원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문제이다.
- (복소수 거듭제곱은 분지 절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능한 모든 분지에 대하여 이는 초월수이다. 예를 들어, 한 분지에서는 이다.)
- 0이 아닌 유리수 에 대하여 , , .
- 1이 아닌 양의 유리수 에 대하여,
겔폰트-슈나이더 정리에 따르면, 가 0 또는 1이 아닌 대수적 수이고 가 무리 대수적 수일 때, 는 초월수이다.
다음과 같은 실수는 리우빌 상수라고 하며, 초월수이다.
:
는 초월수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만약 샤누엘 추측이 참이라면, 는 초월수이다.
6. 역사
고대 수학에서는 대수적 수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무리수의 발견과 거듭제곱근 및 사칙 연산으로 나타낼 수 없는 수(아벨-루피니 정리)의 발견 이후, 모든 수가 정수 또는 유리수 계수의 다항식의 근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즉 초월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레온하르트 오일러는 대수적 수와 초월수를 최초로 구분하였고, 초월수의 존재를 추측하였다.[5] 1844년에 조제프 리우빌은 최초로 초월수의 예로 리우빌 상수를 제시하였다.[6][7]
리우빌 상수는 초월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수이다. 수학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수 가운데 처음으로 초월수임이 증명된 수는 e이며, 이는 샤를 에르미트가 1873년에 증명하였다.[8] 1882년에는 페르디난트 폰 린데만이 원주율 또한 초월수임을 증명하였다.[9] 이것은 고대 그리스 수학의 난제였던 원적문제가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1874년에 게오르크 칸토어는 실수 또는 복소수의 집합이 비가산 집합임을 증명하여, 대부분의 복소수가 초월수임을 보였다 (칸토어의 정리).
다비트 힐베르트는 1893년에 π와 e의 초월성에 대한 간단한 새로운 증명을 발견하였다.[10] 1900년에 힐베르트는 힐베르트의 23 문제 가운데 7번째 문제로, 만약 a가 0 또는 1이 아닌 대수적 수이며 b가 무리 대수적 수일 경우 ab가 초월수인지 여부를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1934년에 겔폰트-슈나이더 정리에 의해 참임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1960년에 앨런 베이커에 의해 확장되었다.
7. 수론적 성질
무리수 ''α''에 대해, 임의의 양수 ε에 대해, 어떤 양의 상수 ''c'' = ''c''(ε)가 존재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
위 식은 ''q'' > ''c''를 만족하는 모든 유리수 ''p''/''q''에 대해 성립한다. 이때 ''μ''의 하한 ''μ''(''α'')를 ''α''의 '''무리수도''' (measure of irrationality for ''α'')라고 한다. 만약 이러한 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로 정의한다. 즉, 무리수도는 ''α''를 유리수로 근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근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임의의 유리수의 무리수도는 1이 된다.
후르비츠는 1891년에 다음과 같은 정리를 증명했다.
임의의 무리수에 대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기약 분수 ''p''/''q''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
또한, 위 상수 는 최적이며, 더 작은 양수로 대체할 수 없다. 즉, 모든 무리수에 대해, 무리수도는 2 이상이다[3]。
리우빌은 1844년, ''α''가 ''n''차의 실수 대수적수 (실수인 대수적수)일 때, ''μ''(''α'') ≤ ''n''임을 증명했고, 이를 통해 초월수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했다.
실수 대수적수에 대한 ''μ''(''α'')의 평가는 그 후 투에 (A. Thue), 지겔, 겔폰트 (A. O. Gel'fond), 다이슨 등에 의해 개선되었고, 최종적으로 로스에 의해 ''μ''(''α'') = 2임이 증명되었다. (디오판토스 근사 참조). 로스는 이 공적으로 1958년 필즈상을 수상했다.
위의 내용으로부터, 무리수도가 2보다 큰 실수는 초월수가 되지만, 초월수라고 해서 무리수도가 2보다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연로그의 밑 ''e''의 무리수도는 2이다.
대부분의 모든 실수에 대해, 무리수도는 2임이 알려져 있지만, 무리수도가 알려지지 않은 수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원주율 π의 무리수도가 2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7.10321 이하임이 증명되었을 뿐이다[4]。
8. 집합론적 성질
대수적 수의 집합은 가산 무한 집합이다.
반면, 복소수체의 크기는 이므로, 대부분의 복소수는 대수적 수가 아니다. 즉, 초월수이다.
그러나 주어진 수가 대수적인지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오일러 상수와 같이 오래 알려진 수조차도 대수적 수인지, 심지어 유리수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1]
참조
[1]
간행물
Some of the following examples come from Hardy, Wright, 1972, pp=159–160, 178–179
[2]
간행물
Also, Liouville's theorem can be used to "produce as many examples of transcendental numbers as we please," cf. Hardy, Wright, 1972, p=161ff
[3]
문서
無理数度が 2 以上であること自体は、ディリクレの部屋割り論法からでも証明可能である。
[4]
웹사이트
Irrationality Measure
https://mathworld.wo[...]
2024-05-05
[5]
논문
Some Remarks and Problems in Number Theory Related to the Work of Euler
1943-12
[6]
논문
Mémoires et communications des Membres et des correspondants de l’Académie
[7]
논문
Sur des classes très étendues de quantités dont la valeur n’est ni algébrique ni même réductible à des irrationnelles algébriques
[8]
논문
Sur la fonction exponentielle
[9]
논문
Über die Ludolph’sche Zahl
[10]
논문
Ueber die Transcendenz der Zahlen ''e'' und π
http://www.cs.toront[...]
[11]
서적
ICM Paris 1900
2015-08-2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